검색결과 리스트
소설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8.05.06 1년 반 만의 소설 읽기: 남쪽으로 튀어 (오쿠다 히데오)
글
Kaleidoscope speaks.../for Dionysus
2008. 5. 6. 14:20
1년 반 만의 소설 읽기: 남쪽으로 튀어 (오쿠다 히데오)
지난 한달여의 시간 동안 치룬,
생의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학교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또 일주일 동안을 넋나간 사람처럼 시간을 흘려 보냈다.
그사이 두번째 석사학위를 주겠다는 메일이 학교에서 왔고,
첫번째 박사학위 "후보"가 되었다는 통지가 날라왔다.
개운해 질 것이라 기대했던 머리는 채 배설되지 못한 사고의 파편들이
거친 모서리로 콕콕찔러대는지 여전히 가깝하고,
"시험만 끝나면" 하고서 나름 계획이랍시고 다짐했던 일들은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미루어지던 차였다.
어떻게 이상황을 탈출해 볼까 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지난 겨울 어느 언저리에 흘려들었던
사회학과 이박사(진)이 가지고 있다던 "한글로 된" 소설 책들이었다.
영어는 이미 시험과정에서 내겐 아직 입출력이 원활한 언어라기 보단,
암호화된 기호와 코드임을 글과 말로 내가 증명해 보인 바 있어
선뜻 유희를 할 만한 도구는 아닌게 분명했으니 말이다.
어쨌든 운동도 마무리 운동이 있다니,
쥐어짜내던 머리도 뭔가 "후희"과정이 있어야 할 것도 같았다.
한무더기의 소설 봉다리를 지난 주말 넘겨 받고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것이 결국 일본 소설의 번역본인,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 였다.
그러고 보니, 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영화 오래된 정원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과 출소한 아버지의 만남 장면을
이야기 하던 중에 했던 것도 같다. 일본소설에도 비슷한 세대교차 구조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 기억 때문인지, 봉다리 안의 책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읽고 싶어졌던 듯.
90년대 초반이었던가 하여간 후일담 문학의 전성기 이래,
한동안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도 같았던,
운동권 "이야기"에 굶주린 것이던 것도 같고.
삶의 의욕이란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것들과의 마찰열로 발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어떤 정서적 후퇴와
반동의 순간에 겹쳐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 소설은 그런 "전공투" 로망 소설과는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더 특별했던 듯.
너무 오랜만이었다. 한글로 소설을 읽는 것은.
1년 반만이었나? 2006년 겨울 하얼빈 가면서 사갔던 소설책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니 말이다.
소설책 읽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면,
어쩌면 좀 더 심사숙고 했을 지도 모르겠다.
사족이지만, 그때 읽은 무슨 문학상 수상작품 집을 읽고 한글 소설들에 실망했던 것이,
봉다리 속 몇몇 한국 작가들의 작품보다 일본 소설 번역본을 쥐어들게 된 계기인것도 같다.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셨다는데, 죄송스러운 일이구만...사실 나는 토지를 아직 읽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다지 정서적 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정래나 황석영 같은 작가에겐 좀 있으려나?)
오랜만에 소설읽기를 하는 데도,
이 소설은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았다. 마치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만화방에 간 느낌이었달까.
이틀동안에 정말 시간이 나면 책을 찾는,
그러니까 의무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과정으로 책장을 넘기는 경험을 내게 준데 무엇보다 고마움을 느낀다.
책의 내용 요약이야 이미 일본문학 매니아들, 문학청년들이 다 해놓았을 테니 생략하자.
소설 독후감이란 장르가 옛날 부터 내게 특별히 익숙한 장르적 글쓰기는 아니었던 것도 싶다.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즘의 이상적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일본 학생운동사에 견주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기회였다는 사실은 남겨두기로 하자.
그것도 즐겁고 유쾌하게...
성장소설의 매력이랄까,
일본의 만화적 전통이 만들어낸 묘사와 서술의 독특한 미학이랄까
어설프게 TV 문학관, 단편영화 혹은 장편영화 판권을 예상하며 "저술"을 하는 것만 같았던,
한국의 최근 문학판 풍토에서는 나오기 힘든 작품이란 생각에 미치니,
조금은 답답해지고 시샘이 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내 "빠져듬"이 시사하는 바, 한국어권 독자에게 일본문학이 가지는 독특한 자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단지 식민주의 연구에서 이분법화 시키는 식민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이상의,
호미 바바식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급속한 내면화를 경험하게 되는
또다른 인식론적 지평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기회가 되면, 아...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 싶지만,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접해보고 싶다.
방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저널 아티클들과 책들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지만...
** 노트 :
1. 역자후기에 인용한 Yahoo Japan (2005년 6월) 의 인터뷰 기사는 나름 의미 심장한 듯:
요즘은...잊혀져 버렸지요...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그건 오류였다".....그대로 순수하게 살아갔다면 우에하라 이치로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아나키스트들과는 사뭇 다른 모델이지 않을까?
소설에서 언급한 류큐국 문제가 가지는 일본사 내의 독특한 자리가 있어서 거친 비교를 하긴 힘들 듯.
2. 그나저나 제발 한 손으로 책을 부여잡고 읽을 수 있게 좀 출판들 하시라. 왼손 손가락 디스크 걸릴 뻔했다. 무슨 이론서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종이 재질이 무거운 출판을 해야쓸까? 한국 책들 볼때마다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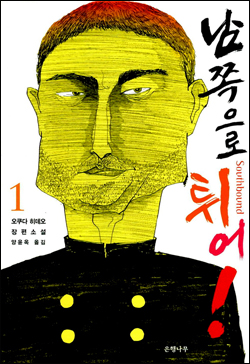
생의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학교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또 일주일 동안을 넋나간 사람처럼 시간을 흘려 보냈다.
그사이 두번째 석사학위를 주겠다는 메일이 학교에서 왔고,
첫번째 박사학위 "후보"가 되었다는 통지가 날라왔다.
개운해 질 것이라 기대했던 머리는 채 배설되지 못한 사고의 파편들이
거친 모서리로 콕콕찔러대는지 여전히 가깝하고,
"시험만 끝나면" 하고서 나름 계획이랍시고 다짐했던 일들은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미루어지던 차였다.
어떻게 이상황을 탈출해 볼까 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지난 겨울 어느 언저리에 흘려들었던
사회학과 이박사(진)이 가지고 있다던 "한글로 된" 소설 책들이었다.
영어는 이미 시험과정에서 내겐 아직 입출력이 원활한 언어라기 보단,
암호화된 기호와 코드임을 글과 말로 내가 증명해 보인 바 있어
선뜻 유희를 할 만한 도구는 아닌게 분명했으니 말이다.
어쨌든 운동도 마무리 운동이 있다니,
쥐어짜내던 머리도 뭔가 "후희"과정이 있어야 할 것도 같았다.
한무더기의 소설 봉다리를 지난 주말 넘겨 받고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것이 결국 일본 소설의 번역본인,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 였다.
그러고 보니, 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영화 오래된 정원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과 출소한 아버지의 만남 장면을
이야기 하던 중에 했던 것도 같다. 일본소설에도 비슷한 세대교차 구조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 기억 때문인지, 봉다리 안의 책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읽고 싶어졌던 듯.
90년대 초반이었던가 하여간 후일담 문학의 전성기 이래,
한동안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도 같았던,
운동권 "이야기"에 굶주린 것이던 것도 같고.
삶의 의욕이란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것들과의 마찰열로 발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어떤 정서적 후퇴와
반동의 순간에 겹쳐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 소설은 그런 "전공투" 로망 소설과는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더 특별했던 듯.
너무 오랜만이었다. 한글로 소설을 읽는 것은.
1년 반만이었나? 2006년 겨울 하얼빈 가면서 사갔던 소설책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니 말이다.
소설책 읽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면,
어쩌면 좀 더 심사숙고 했을 지도 모르겠다.
사족이지만, 그때 읽은 무슨 문학상 수상작품 집을 읽고 한글 소설들에 실망했던 것이,
봉다리 속 몇몇 한국 작가들의 작품보다 일본 소설 번역본을 쥐어들게 된 계기인것도 같다.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셨다는데, 죄송스러운 일이구만...사실 나는 토지를 아직 읽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다지 정서적 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정래나 황석영 같은 작가에겐 좀 있으려나?)
오랜만에 소설읽기를 하는 데도,
이 소설은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았다. 마치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만화방에 간 느낌이었달까.
이틀동안에 정말 시간이 나면 책을 찾는,
그러니까 의무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과정으로 책장을 넘기는 경험을 내게 준데 무엇보다 고마움을 느낀다.
책의 내용 요약이야 이미 일본문학 매니아들, 문학청년들이 다 해놓았을 테니 생략하자.
소설 독후감이란 장르가 옛날 부터 내게 특별히 익숙한 장르적 글쓰기는 아니었던 것도 싶다.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즘의 이상적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일본 학생운동사에 견주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기회였다는 사실은 남겨두기로 하자.
그것도 즐겁고 유쾌하게...
성장소설의 매력이랄까,
일본의 만화적 전통이 만들어낸 묘사와 서술의 독특한 미학이랄까
어설프게 TV 문학관, 단편영화 혹은 장편영화 판권을 예상하며 "저술"을 하는 것만 같았던,
한국의 최근 문학판 풍토에서는 나오기 힘든 작품이란 생각에 미치니,
조금은 답답해지고 시샘이 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내 "빠져듬"이 시사하는 바, 한국어권 독자에게 일본문학이 가지는 독특한 자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단지 식민주의 연구에서 이분법화 시키는 식민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이상의,
호미 바바식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급속한 내면화를 경험하게 되는
또다른 인식론적 지평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기회가 되면, 아...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 싶지만,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접해보고 싶다.
방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저널 아티클들과 책들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지만...
** 노트 :
1. 역자후기에 인용한 Yahoo Japan (2005년 6월) 의 인터뷰 기사는 나름 의미 심장한 듯:
요즘은...잊혀져 버렸지요...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그건 오류였다".....그대로 순수하게 살아갔다면 우에하라 이치로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아나키스트들과는 사뭇 다른 모델이지 않을까?
소설에서 언급한 류큐국 문제가 가지는 일본사 내의 독특한 자리가 있어서 거친 비교를 하긴 힘들 듯.
2. 그나저나 제발 한 손으로 책을 부여잡고 읽을 수 있게 좀 출판들 하시라. 왼손 손가락 디스크 걸릴 뻔했다. 무슨 이론서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종이 재질이 무거운 출판을 해야쓸까? 한국 책들 볼때마다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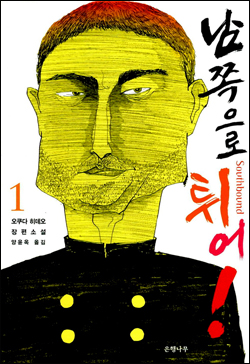

RECENT COMMENT